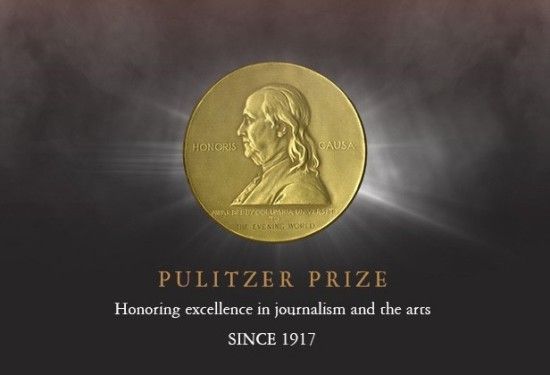 ⓒ
ⓒ
나는 기레기의 넋이다. 아직도 세상과의 영결(永訣)이 채 아물지 않아 기자사회 이곳저곳을 떠돌며 쉼 없이 기자들을 오욕의 수렁으로 유혹하는 기레기의 넋이다. 천 년은 더 명예롭게 주유할 것 같던 나의 본명(기자, 記者)이 어떤 연유로 쓰레기와 조우해 이다지도 참담하게 몰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억울함과 변명의 경계, 그 어디쯤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기레기의 넋이다.
혹자들은 내 오명(汚名)의 기원과 원인을 저널리즘의 본령이 위협당하고 있는 작금의 뉴스생태계에서 찾는다. 우선 스스로는 단 하나의 뉴스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이 땅의 모든 뉴스를 헐값으로 독식해 자신들의 운동장에 양식하듯이 가두고 오롯이 이 안에서만 뉴스를 유통시키고 소비시키는 포털이 있다. 이 공룡 같은 포털의 횡포에 맞서 각 언론사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로 독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매일같이 고혈(膏血)을 짜내고 구독모델 같은 새로운 마케팅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하루하루 낭패감만 더해갈 뿐이다. 오히려 포털의 힘이 빠지니 소셜미디어가 나오고 이마저 한 물 갔다 싶으니 B급 감수성의 바다, 유튜브의 세계가 열려 이제는 대응하기 보다는 차라리 지금처럼 그냥 노예로 살면서 한 숟가락씩 얻어먹고 연명하는 게 나을 지경이 됐다.
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독보적인 이 포털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플랫폼들은 광고와도 직결돼 있다. 이미 기사를 써서 먹고사는 언론사들 보다 기사를 팔아서 먹고사는 언론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광고 하나 받고 기사 하나 쓰거나 빼주는 일은, 그래도 고고한 척 하려는 데스크들의 위선만 한꺼풀 벗겨내면 대다수 언론사에서 상식이 돼버렸다. 심지어 특정 언론사가 특정 진영의 이익에 봉사하고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일은 더 자연스럽고 더 오래됐다. 입만 열면 중도(中道)와 진실을 외치는 이 나라의 언론사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반쪽짜리 국민들이며 이런 언론사들의 극단적인 편 가르기에 선택적 노출과 확증편향으로 기꺼이 호응해오던 일부 국민들은 어느덧 가짜뉴스도 마다하지 않게 됐다.
그러나 내가 기레기로 무너진 이유를 포털과 광고, 정파성의 엄습(掩襲)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함이 있다. 어쩌면 이 불행의 씨앗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잉태됐을지도 모를 일이다. 기자와 검사, 국세청 직원이 함께 술을 먹으면 술값은 술집 주인이 낸다는 그 시절, 지금은 국장과 본부장 등 각 언론사 뉴스룸의 수장, 혹은 그 이상의 반열에 올라있는 우리들의 따거(大哥, 큰형님)들은 종종 기자실 아랫목에서 화투와 포커, 바둑으로 하루해를 지새우기도 했다. 그 옆에 어김없이 쌓여있는 짜장면 그릇에 연신 담뱃재를 떨어대며, 기자실 말단 공무원들을 몸종 부리듯 술심부름까지 시켜가며, 그야말로 갑질과 허세가 낭만으로 포장되고 촌지와 휴가비가 일상이었던 구악들의 유금세월(流金岁月)이었다. 어쩌면 그 흔한 반성과 참회도 없이 막무가내로 반복되던 지난날의 이런 흑역사는 뒷날 후배기자들을 궤멸시킨 기레기 불명예의 자연스러운 전조가 됐고, 급기야 지금의 총체적 언론 불신과 위기를 운운할 수 있는 초석이 됐다.
그래도 한 가지, 따거들의 위대한 유산은 기억해야한다. 그 시절의 일탈을 한 때의 치기로 돌려세우고도 남을 정도의 병적인 열정, 경찰서 도제식 기자교육의 오랜 전령답게 오직 팩트에 의지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던 야성(野性)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. 스스로를 괴롭히다 못해 아예 장렬히 산화시키려는 듯 극한의 집요함으로 토해내던 사자후는 사실성과 독립성이라는 눈부신 경책(警策)을 일궈냈고, 이는 저널리즘의 대원칙이 됐다. 하여, 그 시절의 막내였던 지금의 우리들은 그 뒤 혹독하리만큼 기구했던 따거들의 인생유전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. 정치권과 사주로부터의 외풍을 막아주며 후배 기자들의 성역을 지켜주던 파수꾼에서 이제는 ‘시장 친화적 저널리즘’이라는 미명 하에 광고협찬의 총아로 그 눈물겨운 앵벌이의 선두에 서게 됐고,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파고까지 뒤집어쓰며 ‘경영진의 막내’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. 이미 기레기로 추락한 우리들의 훗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.
진영의 논리에 따라 언론을 소비하는 이 기막힌 시대에도 ‘디지털 네이티브’라고 불리는 새로운 병아리들이 오직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 바닥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. 기레기라 불리는 선배로 차마 볼 낯이 없다. 아직도 나만이 어두운 미망(迷妄)에서 헤매고 있다.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. 문득 눈을 감으면 생각난다. 어린 날, 경찰서 화장실 옆 허름한 문간방 라꾸라꾸 침대에서 서러운 눈물을 베개 삼아 벌레처럼 웅크려 잠든 뒤 새벽 한기에 나도 모르게 잠이 깨 창문 너머 달빛에게 내뱉던 결기의 다짐과 맹세가 생각난다. 그 어느 해 제주 출장 때, 밤새 바다를 밝히다 만선의 휘파람을 불며 항구로 돌아오던 멸치잡이배 위에서 새벽 여명을 등지고 어부들과 나누었던 차디찬 소주 한 잔도 생각난다. 때때로 북한 양강도 호텔 앞 대동강 어귀에서 고양이 세수를 하며 맞이했던 평양의 아침은 왜 그렇게 구슬펐는지, 1호기를 타고 거닐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의 이채로운 공항과 자판 치는 소리만 가득했던 프레스룸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지 궁금하다. 그러고 보니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의원이 후보단일화의 원샷을 하던 그 늦은 밤 포장마차에도, 스님들이 서로 똥물을 퍼부으며 몽둥이를 들고 싸우던 아비규환의 현장에도 나는 있었다. 그리고 그때는, 기레기가 아니었다.
 ⓒ
ⓒ